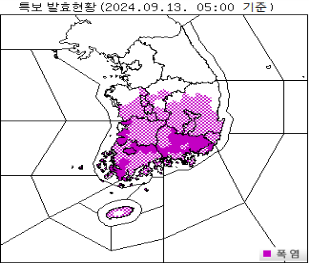|
고향 김천에서 자라던 열여덟 나이 동안에는 나는 김천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도 가지지 못했다. 김천을 떠나 서울 유학을 하던 한참 동안의 세월도 김천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수성을 갖지 못했다. 고향 말이 간직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그 숨겨진 결 (texture)을 거의 본능적 후각으로 어렴풋이 냄새 맡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군대를 경험하게 되면서부터였다.
1970년대 산업화의 바람에 휘몰려 고향 밖으로 분주하게 떠돌 때 도회의 객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 빨리 고향을 떠나 대처로 가야 돈도 벌고 성공의 줄을 잡는다고 굳게 믿었던, 그 ‘탈고향(脫故鄕)의 이데올로기’ 속으로 우리는 떠밀려 갔다. 나 또한 나의 젊은 시절을 큰 도시로 나가서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구하는 행로로 부지런히 달려간 셈이다. 그때 고향은 무엇이고 고향의 언어는 또 무엇이었을까.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은, 고향을 살짝 잊은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만큼 나이 먹어서 돌아보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철딱서니 없음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던 고향 김천 말을 나는 군대에 가서 자각했다. 고향 김천 말이 훈련소의 황량한 연병장에서 팔도 장정들의 낯설기 그지없는 웅성거림 속에서, 험악한 훈련 교관과 조교들의 고함 속에서도 나의 귀를 열고 찾아와 아늑한 위안과 공감의 자락을 마련해 주던 경험이 지금도 새롭다. 보병학교 야전 전술 훈련장에서 고된 훈련에 쩔어있는 나에게 점심 배식을 담당하던 김병장은 내가 배식구 앞에 서자 조용하고 낮은 억양의 김천말로 “박 소위님, 김천 사람 맞아여. 말투 보고 진작 알았다카이. 나는 개령입니다. 개령!” 그는 내 식판 그릇에 누가 봐도 표가 날 정도로 고기를 듬뿍 넣어 주었다. 내가 고향 김천말을 찾아갔다기보다는 김천말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것이 김천말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자각쯤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김천 사람을 만난다는 것과 김천말을 발견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다가오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 내가 김천말에 대한 확실한 자각과 분별 있는 감수성을 갖추게 된 것은 국어교육을 전공으로 삼아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선생 노릇을 하면서부터이었다. 말이란 그 자체로도 무한한 작용과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향토색과 관련해서 말의 묘미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오묘하고도 섬세한 온갖 빛깔의 표정을 다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김천말의 토속적 원형이 가장 순수하게 살아있는 장면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김천 장날의 아래 장터 풍경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황금동 시장 노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얼마간은 덤덤한 듯, 무뚝뚝한 듯 흥정하며, 주고받는 말들 속에는, 달리 말로써 가식을 일삼지 않는 김천말 특유의 분위기가 금방 드러난다. 상대방의 생각에 맞서거나 부정하는 표현도 특별히 억양이 높거나 소리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구조를 가지는 말도 아니다. 길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고향의 말하기 방식이다. "아이고, 고만 오천원 받고 말아여." 사는 쪽의 흥정 붙임이다 "에에이, 안 그래여." 그렇게 팔 수 없다는 부정의 의사 표시이다. 글로써 표현하다 보면 억양이나 액센트를 드러낼 수 없지만, 위의 말들이 가지는 억양이나 톤을 김천 사람이라면 거의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식자층의 사람들이 구사하는 김천말도 단아하고 담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굳이 다른 지역의 특색있는 말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무색무취의 담백함 같은 것이 김천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지하고 단호한 표현일수록 강조의 액센트는 오히려 제거되고 호흡은 더 가지런해지는 특색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의 몸짓·표정(gesture)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별다른 동작이 특별히 가미되지 아니한다. 김천식 점잖음의 한 단면이라고나 할까?
김천말은 이웃 고을인 상주나 대구나 거창이나 영동의 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면모를 가진다. 그러나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들 인근지역의 말과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나는 객지의 거리에서 김천을 포함한 이들 인근지역의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나름대로 말씨를 통해 그들의 고향을 가늠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대게는 어중간하게 서울말과 중화되어 그 본적지의 말 모습이 많이 변질해 있지만, 그래도 그 속 깊은 말의 곁 속에는 자기 고장 말의 본 모습이 얼마간은 남아 있기 마련이다.
그 누군가와 우연히 한 자리가 된 상황에서 몇 마디 말을 나누어 보고, 말씨로서 대중하여 김천 사람인지 타지(他地) 사람인지를 구분해 본다. 말의 느낌이 남달라서 “혹시 김천이 고향 아니십니까?” 하고 묻는다. 용하게 맞추었을 때의 즐거움이란, 맞추었다는 기쁨 외에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즐거움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뭇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다. 바쁜 세상에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부질없어 보이는 일이 매양 가치 없는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고향 밖에서 살다 보면 드물게 만나는 김천 말이 한없이 반갑고 정겹다.
<저작권자 ⓒ 뉴 포커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박인기 교수의 마음의 발견 많이 본 기사
|